오늘도 나는 산길을 걷는다.
새벽부터 차를 달려 군위군 부계면에 있는 思惟園사유원에 와서,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잠시 사유와 명상을 걷는다.
예약과 점심일정을 함께 마련해 주신 동서 형님께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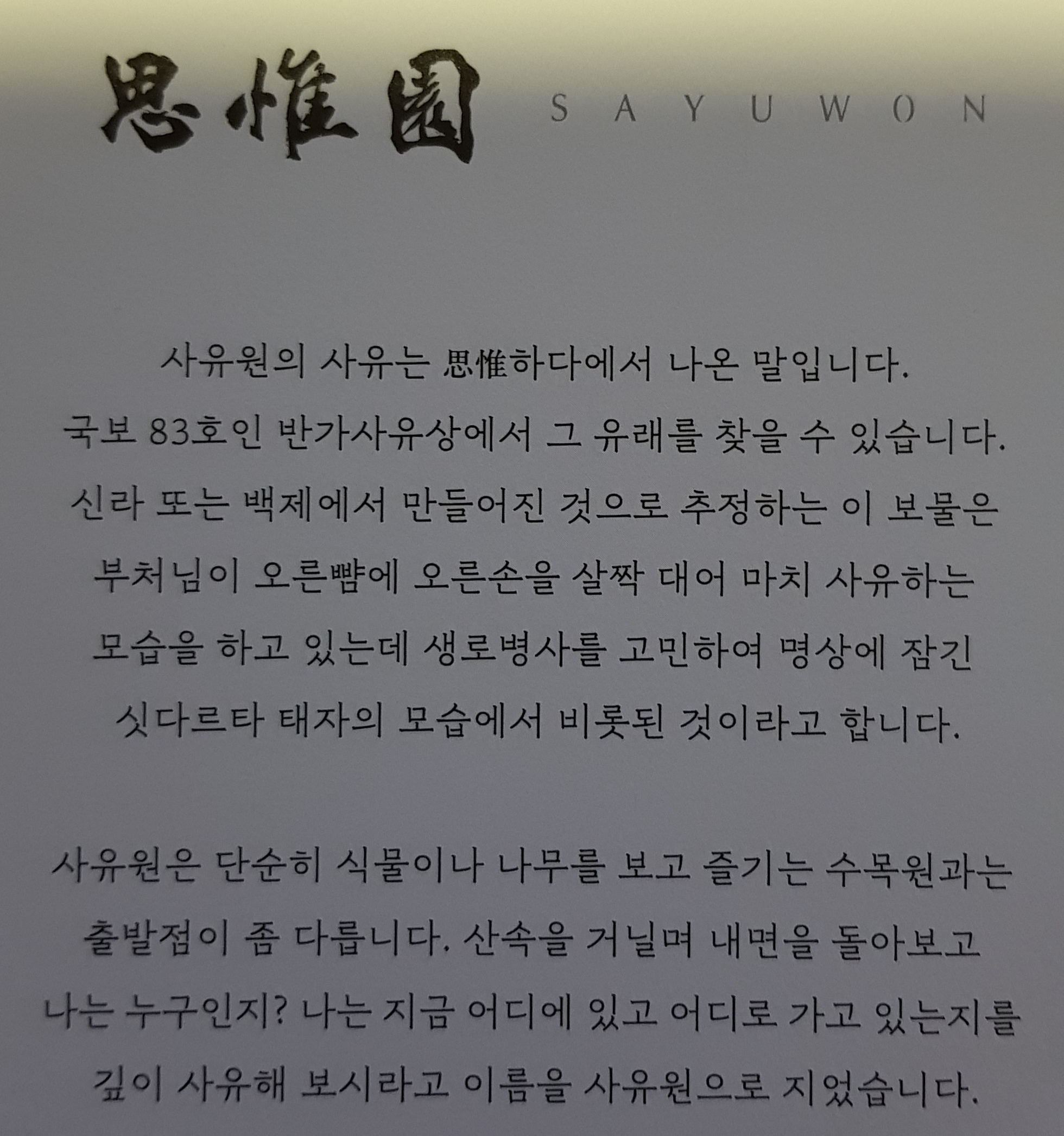
걷기의 일상은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사물을 살펴보게 하고 새 소리와 물흐르는 모양과 공기의 일렁임을 호흡하게 해준다. 땅을 딛는 발의 감촉과 흔드는 팔에서 부딪히는 바람의 감촉이 서로 다른 감각을 일깨우듯, 물에서 먹이 잡는 흰색 왜가리(백로)와 나무 둥지 위에 앉아 있는 검은 까치나 까마귀의 색조가 유난히 대비되어 또한 서로 다른 감흥을 느끼게 해준다.
산등성이를 수 놓은듯 서 있는 나무들, 그 가지 꼭대기 위로 걸친 하늘과 구름들, 그 각각의 자태ㆍ 형상ㆍ색상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있다. 사유원을 걸으며 이 모든 것들은 틀림이 아니고 각각 다름의 존재 이유를 갖고 있음과 보고 느끼는 사람에 따라 나름의 시각과 감각의 관조 또한 다를 것이라는 것을 새삼 사유하게 된다.
걷기는 단순히 운동을 위해 걷는 경우도 있고, 오늘처럼 사물이나 형상이나 그 색상이나 또 그에 따른 느낌들을 관조하며, 동시에 내삶을 반추하며 인문학의 명상 속으로 내면의 생각을 사유하며 걷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전공 다비드 르 브르통 David Le Breton교수는
그의 <느리게 걷는 즐거움>에서, ''글쓰기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길을 늘리는 효력이 있고..글을 읽는 독자는 상상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걷기에 대한 이야기나 길에 대한 명상을 읽는 일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일이다.''라고 했다.



오늘은 사유원 길을 걷다 만난 겨울 까마귀 얘기로, '브르퉁'이 얘기한 나의 까마귀에 대한 명상과 여러분의 상상을 동시에 여기충족 해볼까 해서 이글을 쓴다.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마라.'
내가 들길을 산길을 걷다가 까마귀만 만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다.
그런데, 이 시조(여말선초의 개국공신 李稷이직의 詩)의 첫 구절이 의미하는 그 뜻은 과연 무엇이며, 무엇을 비유함인가?
거죽만 보고 형상만으로 사물의 특성이나 본질을 함부러 재단하지 말라는 뜻인지, 새를 의인화하여 그 흔한 인간의 이중인격을 말한 것인지, 시시비비에 대하여 누가 옳고 그른지를 주관적으로 한가지만으로 따지지 말라는건지, 이 중 하나를 아니면 모두를 다 의미하는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지 못하겠다.
이직선생은 누구 편을 들기 위해, 무엇을 나무라기 위해 하필이면 까마귀와 백로를 대비하여 화두에 올렸을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까마귀가 검다고 해서 특별히 싫어하지도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대체로 사람들은 다른 새에 비해 까마귀를 유독 싫어 하는 것 같다.
무엇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울음소리와 몸통의 온통 검은색(부리마저 검다)때문이라 추측해 본다.
까마귀나 까치나 검기는 매일반이고 둘 다 농작물을 해치기도 하며 해충을 잡아먹어. 이로움을 주기도 하는데, 그 중 까마귀는 완전 검고, 까치는 배에 흰색도 좀 있고 그래서 더 예쁘게 검다.



''아침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오고, 저녁 까치가 울면 초상이 나고..한다는 것도 언제부터 전해오는 말인지 누구 하나 알 턱이 없었다''(金東里김동리, 까치소리, 1966년 현대문학)
소설에서 보듯, 그래도 까치는 길조도 되었다가 흉조도 되니 까마귀보다는 낫게 여겨진다.
그런데 까마귀는 그 검은색 때문에 사람들이 까마귀를 무조건 싫어하고 흉조로만 여기는 것은 김동리선생 말 마따나 '언제부터 전해오는 말인지 누구 하나 알 턱이' 없다.(중국이나 유럽에서도 일반적으로 까마귀는 불길한 새 취급을 받고 있다)



나는 색깔이 검다고 해서 안 좋은 새다, 나쁜 새다, 흉조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달리 까마귀만 보면 침을 뱉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으므로, 나도 까마귀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저 새는 정말 기분나쁜 새인가를 자문하게 될 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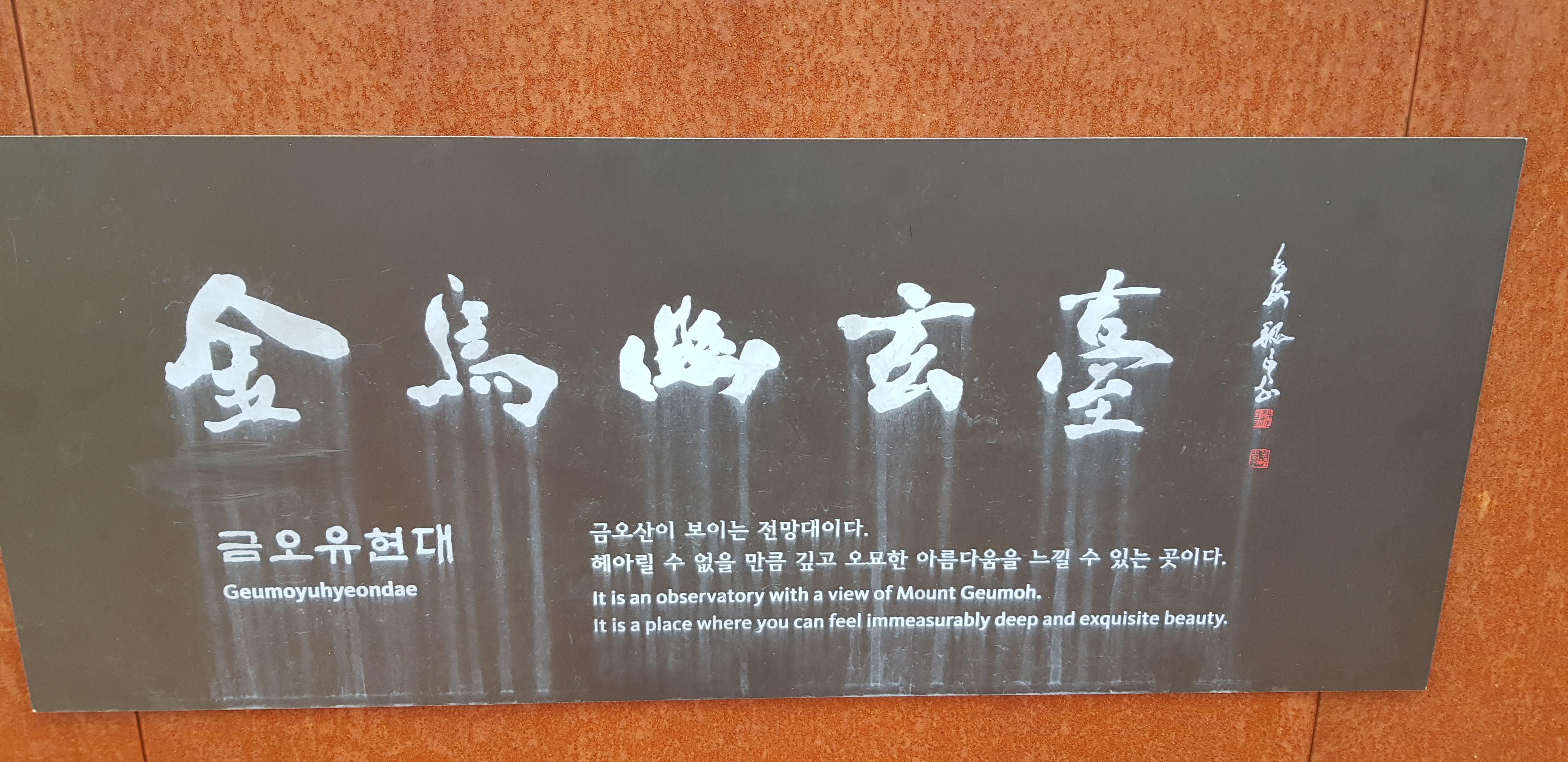


학(두루미)과 황새, 왜가리와 백로, 이 모두는 몸통이 흰색 계통이다.
학은 정수리가 붉고 황새는 꼬리가 검으며 공히 천연 기념물이다. 왜가리는 머리에 댕기가 있고 몸통이 회색에 가깝고 백로는 전신이 온통 희다.
몸통이 흰색 계열인 이 새들은 순수와 선비의 상징이고 복을 가져다주는 길조로 여겨진다. 백로 또한 더러운 습지에서도 먹이 활동을 하곤 하지만 선비로 비유되는 고고한 새로 인식되고 있다.
과연 그런 선비의 상징인 백로가 선비답지 않게 시조의 첫구절처럼 까마귀를 보고 비웃었을까?
백로 자신은 애시당초 까마귀를 탓하지도 나무라지도 관심에도 없었는지를 모르지 않은가?
백로는 어느 경우에나 무조건 옳고 까마귀는 무조건 그른가?



과연 여러분은 까마귀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까마귀는 정말 그렇게 비난받고 외면받아 마땅한 새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그리고 오늘 지금 필자의 말을 듣고나서는 까마귀와 백로에 대해 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무슨말인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고, 음, 하고 다시금 생각해보며 명상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한 숨 돌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용후생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의 조카에게 쓴 까마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기로 한다.
그 이후의 의견과 통찰은 오로지 독자 여러분들의 명상의 몫이다.



°°°°°°°°°°°°°°○●°°°°°°°°°°°°°°°
<총명한 선비(*達士)에게는 괴이하게 생각되는 것이 없으나 무식한 사람(*俗人)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그야말로 견문(見聞)이 적으면 괴이하게 여김이 많다는 뜻이다. 총명한 선비는 한 가지를 들으면 눈에는 열 가지가 형상화되고 열 가지를 보면 마음에는 백 가지가 설정되어 천 가지 괴이한 것과 만 가지 신기로운 것에 대해, 그 물건의 본질에 충실하여 객관적으로 보려 하되 주관을 섞지 않는다.
그런 까닭으로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응수를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다. 본 것이 적은 사람은 해오라기를 가지고 까마귀를 비웃고 물오리를 들어서 학의 자태를 위태롭게 여긴다.
그 사물 자체는 전혀 괴이하다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성을 내어 꾸짖으며, 한 가지라도 제 소견과 달라도 천하만물을 다 부정하려고 덤벼든다.



아아! 저 까마귀를 바라보자.
그 날개보다 더 검은 색깔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햇빛이 언뜻 흐릿하게 비치면 옅은 황금빛이 돌고, 다시 햇빛에 빛나면 연한 녹색으로도 되며, 햇빛에 비추어 보면 자줏빛으로 솟구치기도 하고, 눈이 아물아물해지면서는 비취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푸른 까마귀(蒼鳥)라고 불러도 옳으며, 붉은 까마귀(赤鳥)라고 불러도 역시 옳을 것이다. 그 사물에는 애초부터 정해진 색깔이 없건만 그것을 보는 내가 눈으로 색깔을 먼저 결정하고 있다.
어찌 눈으로만 색을 결정하는 것뿐이랴? 심지어 보지도 않고 미리 마음속으로 결정해 버리기도 한다.



아아! 까마귀를 검은 색깔에다 봉쇄시키는 것쯤이야 그래도 괜찮다. 이제는 천하의 모든 빛깔을 까마귀의 검은색 하나에 봉쇄시키려 한다. 까마귀가 과연 검은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소위 푸른빛, 붉은빛을 띤다는 것은 바로 검은색 가운데서 푸르고 붉은 빛이 난다는 사실을 의미함을 그 누가 알고 있으랴?
검은색을 어둡다고 보는 사람은 까마귀만 모를 뿐 아니라 검은색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물은 검붉기 때문에 능히 비출 수 있고 옻칠은 까맣기 때문에 능히 비추어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색깔이 있는 것치고 광채가 없는 것은 없고, 형체가 있는 것치고 맵시가 없는 것은 없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아아, 슬프다!
세속의 무식한 사람은 까마귀를 비웃고 학을 위태롭게 여김이 또한 매우 심하겠지만 정원에 있는 까마귀는 자줏빛으로 변하기도 하고 혹 비취빛으로 변하기도 한다. 세속의 무식한 사람은 재를 올리는 중이나 진흙 소상처럼 미인을 가만히 고정시키려 하겠지만 미인의 춤사위와 걸음걸이는 하루가 다르게 더욱 경쾌하고 맵시 있게 되고, 앓는 이와 쪽진 머리는 다 나름대로 자태가 있는 법이다.
세속의 무식한 사람들의 노여움이 하루하루 불어나리라는 것을 의심할 바 없다.



세상에는 총명한 선비는 적고 무식한 사람들은 많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자코 있는 것이 옳으리라.
그런데도 말을 그치지 않음은 무슨 까닭인가?
어허! 연암 노인이 연상각(烟湘閣)에서 쓰노라. >
ㅡ菱洋詩集序능양시집서,
연암 박지원, 김혈조譯.학고재刊
(*연암이 그의 조카 능양 朴종선의 시집에 대하여 쓴 序文)